 [시골마을에서 논어를 읽다 15] 노자안지(老者安之), 붕우신지(朋友信之), 소자회지(少者懷之) _노인들은 편안히 모시고, 벗들은 믿음으로 대하며, 젊은이들은 품어 주고 싶다
5-26 안연과 계로가 공자를 모실 때 일이다. 공자가 말했다. “각자 너희들이 품은 뜻을 말해 보겠느냐?” 그러자 자로가 말했다. “수레와 말과 옷과 갖옷을 벗들과 나누어 쓰다가 닳아 없어져도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연이 말했다. “잘하는 일을 떠벌이지 않고, 힘든 일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로가 말했다.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노인들은 편안히 모시고, 벗들은 믿음으로 대하며, 젊은이들은 품어 주고 싶다.” 顔淵季路侍. 子曰, 盍各言爾志? 子路曰, 願車馬衣輕裘與朋友, 共敝之而無憾. 顔淵曰, 願無伐善, 無施勞. 子路曰, 願聞子之志. 子曰, 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 어떤 삶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가. 앞에 올 자기 삶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리는 일이면서..
[시골마을에서 논어를 읽다 15] 노자안지(老者安之), 붕우신지(朋友信之), 소자회지(少者懷之) _노인들은 편안히 모시고, 벗들은 믿음으로 대하며, 젊은이들은 품어 주고 싶다
5-26 안연과 계로가 공자를 모실 때 일이다. 공자가 말했다. “각자 너희들이 품은 뜻을 말해 보겠느냐?” 그러자 자로가 말했다. “수레와 말과 옷과 갖옷을 벗들과 나누어 쓰다가 닳아 없어져도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연이 말했다. “잘하는 일을 떠벌이지 않고, 힘든 일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로가 말했다.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노인들은 편안히 모시고, 벗들은 믿음으로 대하며, 젊은이들은 품어 주고 싶다.” 顔淵季路侍. 子曰, 盍各言爾志? 子路曰, 願車馬衣輕裘與朋友, 共敝之而無憾. 顔淵曰, 願無伐善, 無施勞. 子路曰, 願聞子之志. 子曰, 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 어떤 삶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가. 앞에 올 자기 삶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리는 일이면서..
 [시골마을에서 논어를 읽다 14] 교언영색주공(巧言令色足恭) _훌륭한 말솜씨와 잘 꾸민 얼굴빛과 지나친 공손함을 부끄럽게 여기다
5-25 공자가 말했다. “말솜씨가 좋고, 얼굴빛을 잘 꾸미며, 공손함이 지나친 것을 좌구명이 부끄러운 일로 여겼는데, 나 역시 부끄럽게 생각한다. 원망을 감추고 그 사람과 벗하는 것을 좌구명이 부끄러운 일로 여겼는데, 나 역시 부끄럽게 여긴다.” 子曰, 巧言令色足恭, 左丘明恥之, 丘亦恥之. 匿怨而友其人, 左丘明恥之, 丘亦恥之. 배병삼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새긴다. 말솜씨가 좋고 얼굴빛을 잘 꾸미며 지나치게 공손한 자세를 수치로 여긴 것은 “자신의 이중성을 부끄러워함이니 겉과 속이 다름을 뉘우침”이요, 마음에 원망을 숨기고 그 사람과 벗하는 처세를 수치로 여긴 것은 “남을 대하는 태도의 이중성을 부끄러워함”이다. 전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성찰, 곧 충(忠)이고, 후자는 타자에 대한 자기 성실성의 성찰..
[시골마을에서 논어를 읽다 14] 교언영색주공(巧言令色足恭) _훌륭한 말솜씨와 잘 꾸민 얼굴빛과 지나친 공손함을 부끄럽게 여기다
5-25 공자가 말했다. “말솜씨가 좋고, 얼굴빛을 잘 꾸미며, 공손함이 지나친 것을 좌구명이 부끄러운 일로 여겼는데, 나 역시 부끄럽게 생각한다. 원망을 감추고 그 사람과 벗하는 것을 좌구명이 부끄러운 일로 여겼는데, 나 역시 부끄럽게 여긴다.” 子曰, 巧言令色足恭, 左丘明恥之, 丘亦恥之. 匿怨而友其人, 左丘明恥之, 丘亦恥之. 배병삼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새긴다. 말솜씨가 좋고 얼굴빛을 잘 꾸미며 지나치게 공손한 자세를 수치로 여긴 것은 “자신의 이중성을 부끄러워함이니 겉과 속이 다름을 뉘우침”이요, 마음에 원망을 숨기고 그 사람과 벗하는 처세를 수치로 여긴 것은 “남을 대하는 태도의 이중성을 부끄러워함”이다. 전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성찰, 곧 충(忠)이고, 후자는 타자에 대한 자기 성실성의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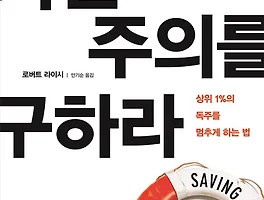 [문화일보 서평]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_ 로버트 라이시, 『자본주의를 구하라』(안기순 옮김, 김영사, 2016)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경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언뜻 보면 당연하다. 정치는 나와는 별 관련 없이 멀어 보이고, 먹고사는 문제는 피부로 와 닿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는 지겨워하지만, 사실 정치가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듯한 허무에 빠져 있지만, 경제를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을 퍼뜨리는 것이야말로, 부를 독점한 소수가 정말로 바라는 일이다. 로버트 라이시는 경제란 사회 바깥에 있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만 비로소 그 사회적 실체를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소수가 부를 독점할 뿐만 아니라, 대항적 세력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부를 독점하기 쉽도록 경제적 규칙을 끝없이 세부적으로 고쳐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화일보 서평]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_ 로버트 라이시, 『자본주의를 구하라』(안기순 옮김, 김영사, 2016)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경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언뜻 보면 당연하다. 정치는 나와는 별 관련 없이 멀어 보이고, 먹고사는 문제는 피부로 와 닿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는 지겨워하지만, 사실 정치가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듯한 허무에 빠져 있지만, 경제를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을 퍼뜨리는 것이야말로, 부를 독점한 소수가 정말로 바라는 일이다. 로버트 라이시는 경제란 사회 바깥에 있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만 비로소 그 사회적 실체를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소수가 부를 독점할 뿐만 아니라, 대항적 세력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부를 독점하기 쉽도록 경제적 규칙을 끝없이 세부적으로 고쳐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