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상자를 풀어서 서가에 꽂으면서 책을 넣었다 뺐다 하는 시간이 한없다. 그 사이사이 땀을 식히면서 안현미 시집 『미래의 하양』(걷는사람, 2024)을 읽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시는 「초생활」이다. 이 시는 어느 날 직장을 때려친 후,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살다가, 석 달도 안 되어 생계 근심에 고통받는 시인의 마음을 생생히 그려낸다. 시의 근심은 몸의 근심에 비해서 얼마나 하찮은가.
월급쟁이 경력 30년 생계는 자신 있다고 산 입에 거미줄을 치더라도 그 거미줄은 예술일 거라고 진심으로 사기쳤다 개뿔 실업급여 수급자 생활 3개월 예술은? 예술은 어디 갔지? 거미줄만 예술이다 슬픔까지 사기다 3개월 동안 30년은 늙어 버린 노파가 중얼거린다 (「초생활」중에서)
직장 다니던 시절엔 차라리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시 쓴다”(「정치적인 시」중에서)라고 호기롭게 외칠 수 있었다. 그런데 정규직 일자리를 버리고 나자, “숨만 쉬어도 최저 100은 있어야” 하는 현실이 무수한 번뇌를 일으킨다.
숨만 쉬어도 최저 100은 있어야 된다는데 주제넘게도 정규직을 때려치우는 모험을 하며 시대착오를 즐기며 산다 번뇌를 반복하고 번복하며 산다 죽기 위해 산다 그냥 산다 빌라에 산다 (「빌라에 산다」중에서)
그런데 빌라가 상징하는 이 가난과 고통,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은 또한 대물림된 것이기도 하다. 「고척동 고모」는 이 시집에서 가장 아픈 시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살았다 열여섯부터 예순아홉까지 (여성) 노동자 아니면 (여성) 해고 노동자로 살아온 그녀에게 고통은 공기와도 같았다 고통과 함께 밥 먹고 고통과 함께 잠들고 고통과 함께 출근했다 한 명의 남편과 네 명의 자식들마저 그녀를 떠났을 때도 고통만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사람들은 고통이 그녀를 병들게 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통을 파먹으며 여태껏 살아남았다고 했다 한번 물어봐요 일생 억척스럽게 살아남느라 고통스러웠는데 고통이라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열여섯부터 예순아홉까지 여성 노동자 아니면 여성 해고 노동자로 살아온 그녀는 말했다 일생 함께 울어 준 것도 웃어 준 것도 고통인데 이제는 피붙이 같다고 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여성)은 두고 가도 고통만은 함께 가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척동 고모」전문)
평생에 걸쳐 (여성) 노동자와 (여성) 해고 노동자로 살아온 고모에게 고통은 피붙이나 마찬가지다. 그녀의 바람은 "언젠가 그날이 오면 (여성)은 두고 가도 고통만은 함께 가 줬으면" 하는 것뿐이다. 이런 삶, 이런 세상에 당국은 아무 관심이 없다.
중대재해도 중대처벌도 중차대하지 않은 당국은 미래가 현재와 현재가 과거와 과거가 미래와 악수하듯 아침엔 주천강 점심엔 동강 저녁엔 한강으로 이름을 바꾸며 흘러갈 것이다 (「안개와 당국」 중에서)
더욱이 서울 중상층의 감각 미학에 사로잡힌 문학도, 운동도, 정치도 별 신경 쓰지 않는다. 빈민들, 노동자들은 당장 죽을 것만 같은데,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배지나 리본 달고, 사고 나면 얼굴 한번 비치고 끝이다. 그러니 고통은 끝이 없고, 노동엔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미래가 있는 사람처럼 죽고 있습니다 // 오늘도 죽고 있습니다 매일 죽고 있습니다 // 떨어져 죽고 끼여 죽고 맞아 죽고 부딪혀 죽고 깔려 죽고 붕괴되어 죽고 있습니다 // 이 시각에도 땀 흘리다 죽고 피 흘리며 죽고 있습니다 // 미래? // 죽음을 갈아넣는 세계와 헛된 죽음의 죽음을 멈추지 않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까 // 알버틴장미 사향장미 다마스크장미 백장미 캐비지로즈 아일랜드의불꽃 아도니스 레이디리딩 스노우퀸 붉은 글자의 날 튜더장미 노수부 바스의 아내 토마스 베케트 에밀리 브론테 티로즈…… 오늘도 제 몫의 이름을 단 수많은 장미들은 피어오르는데 //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미래가 없었던 사람처럼 지고 있습니다 (「노동의 미래」전문)
그러나 안현미는 이 척박하고 힘겹고 어렵고 고통에 찬 현실에서도 여전히 사랑의 가능성을 발명한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시인에 따르면, 그건 한밤의 어둠 속에서, 까만 탁구대를 배경으로 '미래의 하양', 그러니까 희망을 주고받는 일이다.
k가 돌아온 밤은 까마귀보다 검었다 우리는 그날 밤 탁구를 치고 있었기에 그가 데리고 온 밤의 검정과 탁구공의 하양은 꽤 근사하게 어울렸다 주고받는다 받기 위해 준다 주기 위해 받는다 그것밖에 없어서 즐겁다 사랑하고 사랑받는다 사랑 받기 위해 사랑한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는다 헛소리 같지만 그것 밖에 없다 튀어 오르고 튕겨 나간 건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공 같은 것 아무튼 k는 돌아왔고 그가 데리고 온 밤은 까마귀보다 검었고 헛소리 같지만 방금 막 도착한 자정을 향해 튀어 오른 탁구공은 미래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것밖에 없어도 그러하듯이 (「탁구」전문)
가진 게 사랑밖에 없어서, 가장 열렬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풍경이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입속으로 다시 한번 굴려 외워 본다.
"주고받는다 받기 위해 준다 주기 위해 받는다 그것밖에 없어서 즐겁다 사랑하고 사랑받는다 사랑 받기 위해 사랑한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는다 헛소리 같지만 그것 밖에 없다".
그렇다. 우리에겐 그것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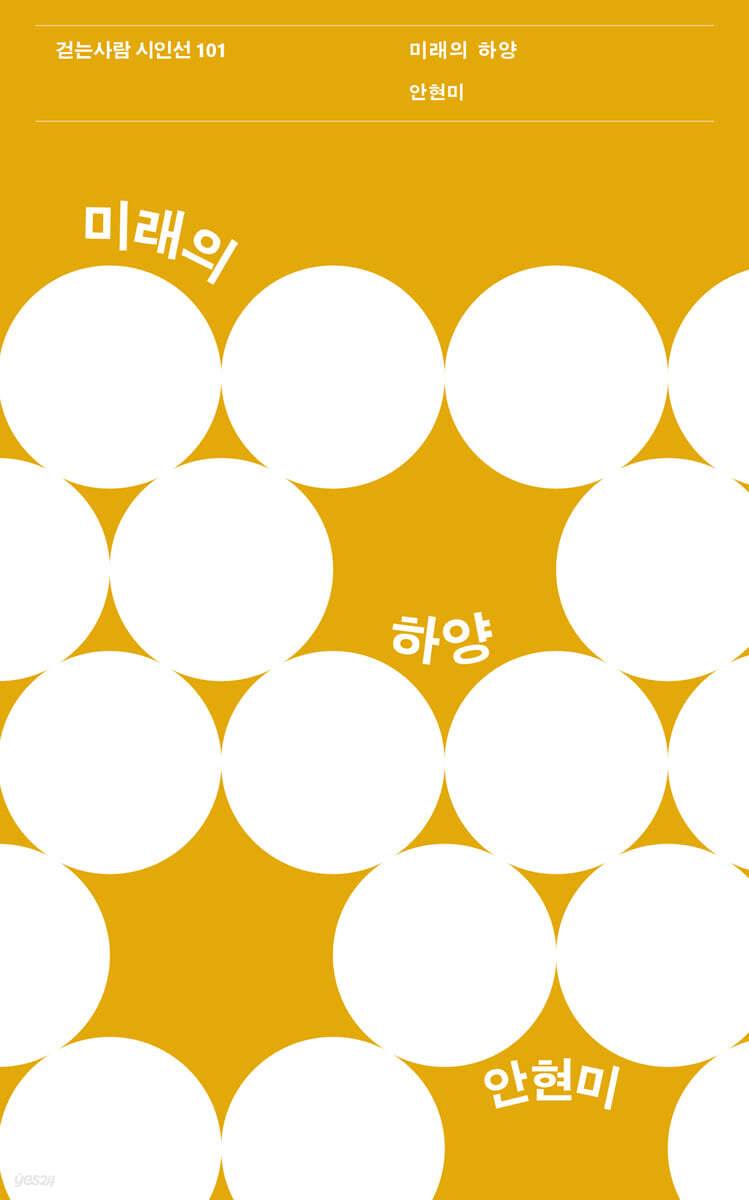
'평론과 서평 > 시와 에세이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옥탑 (이은우) (2) | 2025.06.15 |
|---|---|
| 영원한 햇빛 외(최현우) (0) | 2025.06.08 |
| 한편 소영의 합리적 사고 (1) | 2025.05.16 |
| 종 (임경섭) (0) | 2025.03.23 |
|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비극을 애도하다 (0) | 2025.0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