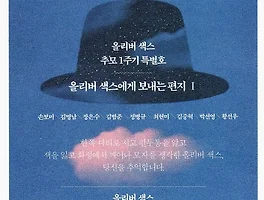연휴에 앤서니 그래프턴의 『각주의 역사』(김지혜 옮김, 테오리아, 2016)를 흥미롭게 읽었다. 이 책을 읽고 있자니 문득 옛날 옛적에 공부 쫌 해 보려고 할 때 생각이 났다. 당시에, 갑자기, 인용부호, 각주, 참고문헌 같은 글의 구성 요소가 근대문학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즉 근대적 문학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런 사소한 부분을 통해 들여다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가 그게 작품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한 친구한테 면박을 당한 적이 있다. 스물다섯 해쯤 전의 일이지만, 이런 책이 무겁게 주목을 받으면서 나오는 걸 보니 세상이 참 달라졌다는 생각이 든다.
편집자가 책의 각 구성요소를 깊이 탐구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에 가깝다. 출판의 대중화 혁명 이후, 학술서를 제외하면 많은 서적의 판면으로부터 각주가 완전히 추방되거나 미주/후주로 이동하는 격변을 겪는 중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판면으로부터의 이탈을 최소화해서 독자의 몰입(가독성)을 극대화하는 편집 전략이 당연한 것으로 일상화한 것이다. 하지만 쓰기는 항상 읽기 이후에 출현함을 생각하면, 오늘날 서적에서 책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적절히 표현할 것인가는 편집 전략의 중대 고민 중 하나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지 노리오의 「책은 도구이다: 21세기에 전집을 펴내는 의미」(『제10회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자료집)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글이다.
각설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각주의 역사를 들여다보자니, 판면의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지식의 특정한 구조화를 어떻게 지탱하는지, 즉 지식과 권력이 상호 침투해 지식/권력으로 구조화하는 과정이 겉보기와는 달리 선명하고 깔끔하기보다 치열하고 치밀한 격전이 은폐된 채 진행 중인지를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오늘날 각주는 진리의 훌륭한 보증장치로서, 인문적 지식을 증명과 반증이 가능한 과학으로 성립시키는 도구이며, 글쓴이가 엄격한 학문적 수련을 거쳤다는 객관적 증명서로 작동한다. 각주를 적절히 구성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 즉 문헌과 자료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 생각을 구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어떤 학자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각주의 역사를 추적해 재구성함으로써, 저자는 과학적 장치로서의 각주라는 근대적 이데올로기가 은폐한 각주의 목소리를 되살린다. 판면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상부의 주장을 하부의 문헌으로 보충(실증)하도록 한 것은 1824년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의 글에서 기원한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저자는 그 이전에도 각주가 다른 형태와 기능을 하면서 풍부하게 존재했음을 밝혀낸다. 가령, 18세기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각주는 풍자의 한 형식으로 기능했으며, 16세기 오귀스트 드 투의 『현대사』에서 각주는 본문의 고증과 검증을 위한 대화의 도구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 학자의 주장을 증명하고 검증하는 과학적 장치로서 격상된 각주는 그 존재만으로 과연 어떤 주장의 진리성을 떠받칠 수 있는가.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많은 경우 각주는 글쓴이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필연적/의도적 선택, 무시, 누락, 왜곡 등을 통해 각주는 때때로 진실을 왜곡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장치가 된다. 또한 오늘날 한국의 지식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주가 딸린 글을 다른 글에 비해 지나치게 특권화하는 이상한 편향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각주를 둘러싼 모든 논란에도 다음과 같은 저자의 말은 분명히 귀담아들을 만하다. “역사가는 각주를 사용함으로써만 자신의 역사 서술을 독백이 아닌 대화로 만들 수 있고 학문적 논쟁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 편집자들이 책의 판면에서 각주를 없애려는 일상적 관행에 대해서 한번쯤 엄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각주를 발명해서 판면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삼은 선배 편집자들은 책을 대화적이고 다성적인 매체로, 즉 저자의 단일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미디어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화음과 동시에 소음을 함께 내는 광장의 미디어를 이루려고 한 듯하다. 어쩌면 위기에 빠진 책 문화를 살리려 할 때, 각주를 넘어서는 새로운 편집 장치를 통해 책의 다성성을 살리려는 시도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들었다. 편집 작업이나 저술 작업에 대해 깊게 성찰해 보려는 이들에게 『각주의 역사』는 풍부한 영감을 제공한다. 서가의 ‘편집/출판’ 칸에 반드시 들어갈 중요한 책이 하나 출간되었다.
'평론과 서평 > 책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_올리버 색스 1주기 추모글 (0) | 2016.09.01 |
|---|---|
| [문화일보 서평] 동물원에서 인간과 역사를 성찰하다 _나디아 허의 『동물원 기행』(어크로스, 2016) (0) | 2016.08.19 |
| [문화일보 서평]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_ 로버트 라이시, 『자본주의를 구하라』(안기순 옮김, 김영사, 2016) (2) | 2016.08.06 |
| “무측천, 잔혹한 여인 아닌 뛰어난 정치인”(황제들의 당제국사 / 임사영 지음, 류준형 옮김/푸른역사) 서평 (0) | 2016.05.15 |
| 르네상스시대에도… 루이 14세때도… 회계(會計)가 곧 ‘심판’이었다 (0) | 2016.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