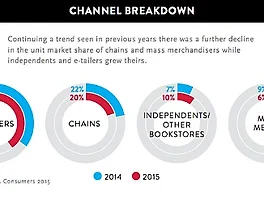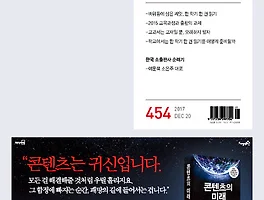지난달, 제주 독립책방 연합에 초대를 받아 강연 겸 여행을 갔을 때 일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밤마다 나누었는데, 올해 환갑을 맞은 편집자 선배 한 분이 드디어 정년퇴직 한다는 말을 들었다. 아아, 아쉬우면서 또 감격스럽다.
출판과 같은 영세하고 변동성이 높으면서도 높은 지적 수준이 필요한 산업에서 평생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른 분야 사람들은 잘 모른다. 심지어 출판계 내부에서도 좀처럼 짐작하지 못하는 듯하다. 이 선배 역시 학술서와 교양서 분야에서 주목할 명성이 있었고, 나중에는 공기관의 출판 담당으로 일했기에 인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본다.
말이 나온 김에 ‘편집자의 직업 경제’를 들려주고 싶다. 25세에 연봉 2400만 원으로 편집자 일을 시작한다고 가정하자. 해마다 5% 정도 연봉이 인상된다면, 법정정년인 60세에는 1억 32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아야 한다. 일정한 금액을 넘으면 물론 경제적 이득보다 마음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이 정도 연봉을 이소당연하게 줄 수 있는 출판사들이 많아야 ‘편집자라는 직업’의 정년이 있기도 쉽고, 이 일에 열정을 쏟는 이들도 늘어난다. 운 좋게 훌륭한 사장을 만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다니고 싶은 출판사가 많아야 하는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김이구 선배도 창비에서 정년을 했다. 1984년 엄혹한 시절에 창비에 입사해서 편집국장, 상무이사를 거치면서 편집자로 일생을 살았다. 아동문학 편집자로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김 선배는 편집자를 “작가를 지속적인 생산자 혹은 의미 있는 생산자가 되도록 하는 능동적 존재”이고, “소비자를 새로운 생산자-작가로 계발시키는 간접적 교육자”라고 정의했다. 하나의 직업을 평생 감당한 이가 말하는 자부심 넘치는 명(銘)이다.
1908년 열여덟 어린 나이로 최남선이 가형과 함께 신문관을 만들고 ‘최초의 편집자’ 역할을 한 이래, 한국의 편집자 문화는 대략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첫머리에 있는 것이 최남선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문인 편집자’다. 문학과지성사, 창비 등과 같은 ‘에콜형’도 있다. 자기 사상이나 생각을 마음껏 표출할 출판사를 스스로 세우고 비슷한 생각을 품은 선후배들의 책도 출판하는 경우.
두 번째 단계는 한창기, 정진숙, 조상원 등 ‘사장 편집자’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 대신 ‘남의 입으로 말하는 자’(칸트)라는 편집자 정체성을 세운 인물들. 민음사, 한길사, 돌베개, 사계절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출판의 위대한 전통을 이룩했다.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전문 편집자’다. 이른바 주간의 시대다. 출판사 경영에는 직접적 관심을 품지 않는 대신 편집권을 수호하고, 저자와 독자 사이의 ‘좋은 연결’에 인생을 불사르고 싶어 하는 인물들. 한국출판의 다양성이 이들로부터 나왔다.
1990년대 초중반, 우리들은 모일 때마다 ‘편집자로 은퇴하자’고 결의한 적이 많았다. ‘사장 편집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사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 무려 한 세대가 걸렸다.
2018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베이비부머의 전설인 ‘58년 개띠들’이 은퇴를 시작한다. 노고를 다해 하나의 직업에 평생을 헌신한 선배 편집자들한테 경의를 바치면서, 그 꿈을 이어받아 편집자라는 직업을 이룩하고자 하는 후배로서 결의를 다져본다.
==============================================
《기획회의》 456호 ‘편집자의 말’로 쓴 글이다.
'직(職) > 책 세상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독립서점, 동네로 돌아오다 (2) | 2018.02.02 |
|---|---|
| 《기획회의》 신간토크 제455호(2018년 1월 5일) (0) | 2018.01.23 |
|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출판 편집자의 할 일 (0) | 2018.01.09 |
| 촛불과 출판 (0) | 2017.12.27 |
| 인쇄소 연쇄 부도에 대하여 (0) | 2017.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