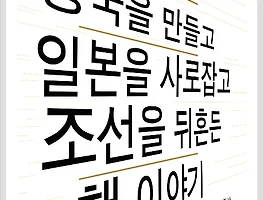올리버 색스 1주기에 맞추어 추모글을 하나 썼습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 대한 글입니다. 왜 저는 올리버 색스의 편집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책을 그렇게 재미있게 읽고, 이후로도 많은 책을 챙겨 읽었는데요. 왜 끝끝내 독자로만 남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래에 그 사연(^^)을 옮겨 둡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올리버 색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조석현 옮김, 알마, 2015)
아주 이상한 일이죠. 닿을 수 없는 신비, 손댈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꼈다 할까요. 일종의 플라토닉 러브,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침대를 같이 쓰고 싶지는 않은 사랑이에요. 읽어서 마음에 닿으면 직접 손으로 문장을 붙잡고, 머리로 형태를 떠올리고, 입으로 동네방네 떠들고, 발로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싶은 게 편집자의 본능 아닌가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의 분명한 좌절, 언제나 낯선 실체로, 그러니까 편집 불능의 중대한 상징으로 존재했지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로 처음 만난 것이 벌써 스무 해 가까이 되었네요. 거대한 충격이었죠. 마력적인 문장이었어요. 정녕 심장을 둘로 쪼개는 듯, 머리를 구멍을 뚫는 듯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그토록 미치게 한 것은 당연히 표현 자체는 아니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가혹한 통찰이 있었죠. 세계를 뒤흔드는, 살아온 인생을 비통하게 만드는 선명한 진실들. 카프카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가 깨어지는 거대한 충격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풋내기였어요. 세상을 한참 몰랐어요. 인생을 이야기할 줄 아는 것은 오로지 문학, 그중에서도 소설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학주의자였어요. 철학은 추상적이고 과학은 숨 막혔죠. 예술이 철학이나 과학 너머에서, 즉 초월적으로 세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무이(無二)한 형식이라고 믿었어요. 오불관언, 제 발밑만 소중한 줄 아는 어린애였던 거예요. 개념으로 삶을 이야기할 수 있고, 수식으로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영혼을 두드리고 정신을 찢을 수 있는 도구는, 언어의 바다 모든 곳에 있었던 거죠. 갑자기 나 자신이 무(無)로 돌아가는 스물네 가지 삶에 대한 당신의 과학적 탐험은, 아아, 그 자체로 문학이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자아란 어떤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한 편의 이야기인 것이죠. 언뜻 보면 완벽하게 짜인 듯하지만, 실제로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느리게 또는 빠르게 변화하는 진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죠.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란 시간의 연속적 습격에 반응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구축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자신은 항상 변화지 않은 채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심지어 사랑조차 얼마나 큰 폭력인가요. 사랑이라는 관계로 타자와 접속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조금도 나로서 존재할 수 없죠. 사랑이란, 지금까지의 나를 영원히 과거로 쫓아내는 행위인 거죠.(사실 모든 만남이 강도의 문제일 뿐 마찬가지예요.)
읽기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읽기는 분쟁을 일으키죠. 어떤 읽기는 살인과 마찬가지 일을 합니다. ‘내면의 드라마’를 완전히 다시 쓰도록 만들어요. 하나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개벽이죠. 급격한 단층이자 비틀린 습곡이기에 완전히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쓰던 원고는 와르르 구겨진 채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새하얀 백지가 눈앞에 펼쳐지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가 그 비슷했어요. 세상이, 인간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속이 뒤집혀서 겉으로 튀어나온 듯, 메스꺼움이 한동안 계속되었죠. 인간이 자기 이야기의 맥락을 잃으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하는 괴물 또는 광인이 된다죠. 성전의 불꽃이 입술에 닿은 것 같은, 날선 도끼로 등뼈를 얻어맞은 것 같은, 다시는 나를 회복하지 못할 읽기의 폭력 속에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환자의 결함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은, 상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능력을 거의 간과했다. (중략) 우리는 소위 ‘결함학’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여서 ‘이야기학’ 쪽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야기학’이야말로 지금까지 무시되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구체성의 과학’인 것이다.”
끈질기게, 지치지 않고, 인생 이야기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변화되지 않은, 상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올리버, 당신이 착각한 거예요. 인간은 항상 자신을 갈아엎고 새로 만들어 가면서, 한없이 자기를 새롭게 생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세게, 조금 많이 주물럭거려야 했을 뿐이죠. 아내를 모자로 만들어서 살아가려면, 뇌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에 다른 이야기를 미처 창조하기 힘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종래의 자아가 아직 변화되지 않고 상실되지 않은 채 남은 것처럼 보였던 거죠.
처음에 고백한 대로, 당신은 제 편집자 인생에, 커다란 구멍이에요. 그토록 당신의 글을 좋아했는데도 책을 편집해 보자고는 한 번도 생각지 못했죠. 돌이켜 보니 당신의 독자로 남아 있는 것조차도 무척 힘들었던 거예요. 다른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죠. 당신의 책을 읽고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릴 만하면 새 책이 나오고……. 편집자로서는 아주 낯선 반복이 지난 스무 해 동안 계속되었던 거예요. 모든 편집자는 항상 독자이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오로지 독자로 살아가죠. 운명적이죠. 그래서 고마워요. 영원히 독자로 남게 해 주어서. 당신 덕분이에요. 그런 삶을 미리 연습할 수 있어서.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